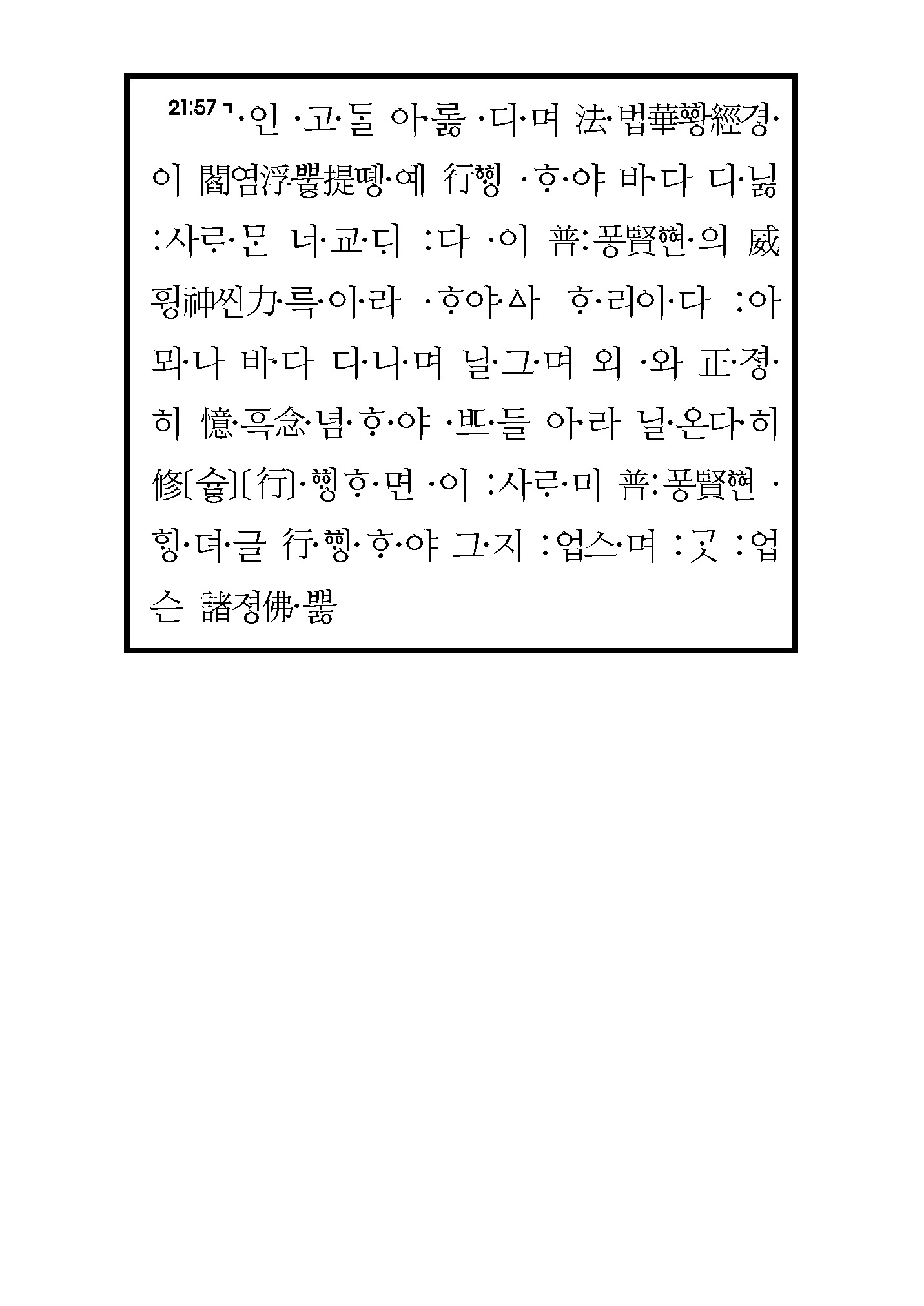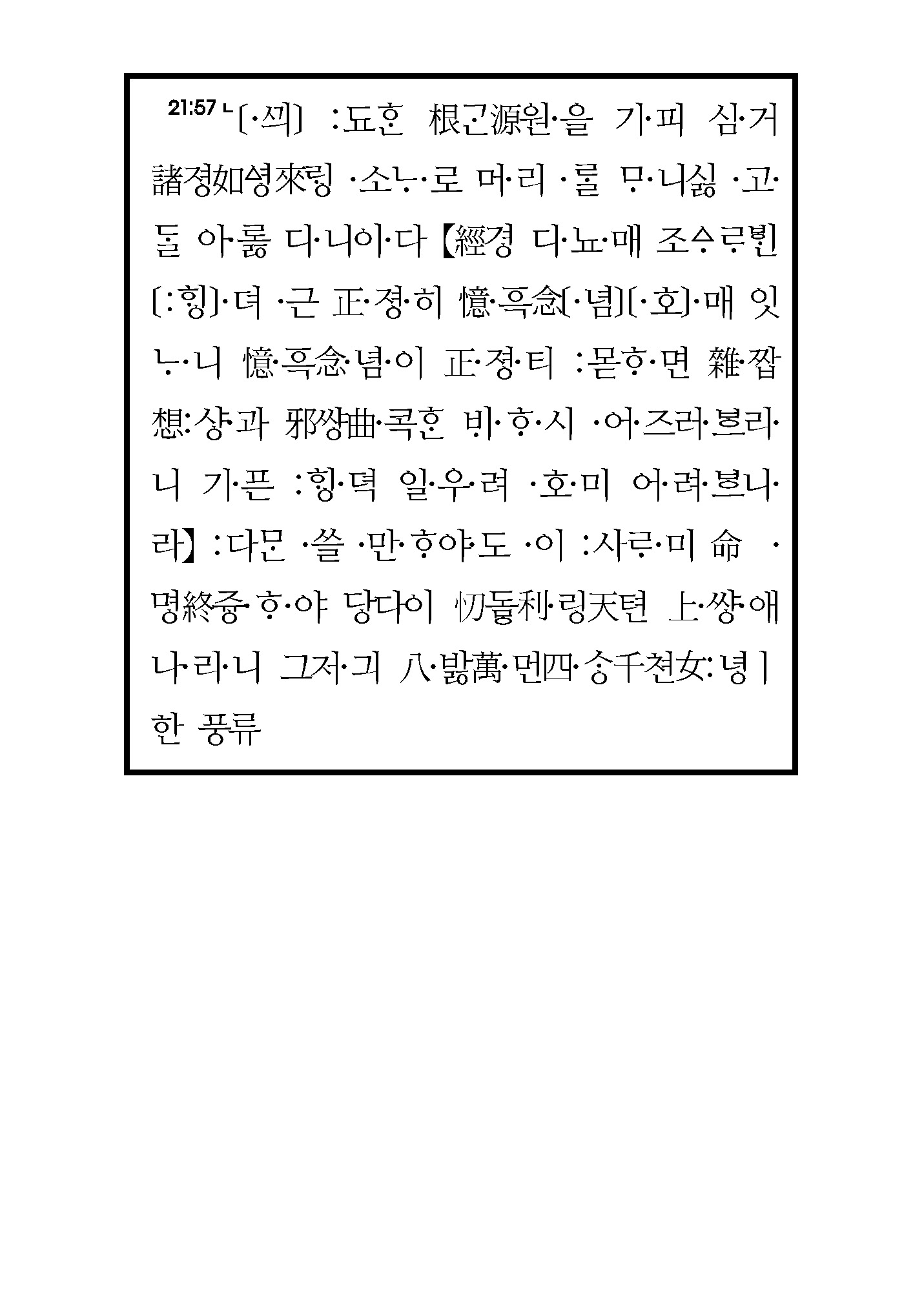- 역주 석보상절
- 역주 석보상절 제21
-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
-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7
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7
[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7]
닐온 다히:
말한 것처럼. 니르-/닐-[云]+오/우(대상 선어말어미)+(/으)ㄴ(관형사형어미)#-[如]+이(부사화접미사). 〈월석〉은 ‘말다’로, 〈법화〉는 ‘말다이’로 언해하였음. ¶네흔 닐온 다히 修行호미니〈영가 상25ㄱ〉. 참조. 네 願다 라〈월석 25:76ㄴ〉. 祭祀를 家禮다이 며〈속삼 효:26ㄱ〉.
석보상절 21:57ㄴ
諸佛 됴 根源을 기피 심거 諸 如來 소로 머리 니 주002) 니:
만지실. 니-[摩]+(/으)시(주체높임 선어말어미)+(/으)ㄹㆆ(관형사형어미). ¶如來 손 내샤 菩薩 니시고 八方如來 가쇼셔 시니〈월석 18:14ㄴ〉.
이 사미 보현(普賢) 뎌글 행(行)야 ~아 디니다:
이 사람이 보현 행적을 행하여 끝없으며 가 없는 제불께 좋은 근원을 깊이 심어 제여래의 손으로 머리를 만지실 곳을 알 것입니다. 해당 원문은 ‘當知是人은 行普賢行야 於無量無邊諸佛所애 深種善根야 爲諸如來ㅣ 手摩其頭ㅣ니다’임. 〈월석〉의 ‘이 사미 普賢行 行야 無量無邊 諸佛ㅅ 거긔 善根 기피 심거 諸如來 소로 머리 지샤미 아 디니’이고, 〈법화〉의 언해는 ‘이 사 普賢行 行야 無量 無邊 諸佛 善根을 기피 심거 諸如來ㅣ 소로 머리 지샤미 왼 반기 아롤 띠니다’임. 한문 원문은 ‘爲’ 피동문인데 〈석상〉은 능동으로 해석하였고, 〈월석〉과 〈법화〉는 피동으로 해석하였음.
디뇨매:
지니므로. 디니-[持]+(오/우)ㅁ(명사형 어미)+에/애(처소의 부사격조사). ¶經 디뇨 盟誓코져 호〈법화 4:186ㄴ〉.
시:
버릇이. [習]+이(주격조사). ¶習은 시라〈법화 1:26ㄱ〉.
어즈러리니:
어지러울 것이니. 어즈럽-[難]+(/으)리(추측의 선어말어미)+(/으)니(원인·이유의 연결어미). ¶세 저품 업스신 行이니 어즈러며 어려믈 리디 아니실씨라〈월석 18:17ㄱ〉.
Ⓒ 필자 | 수양대군(조선) / 1447년(세종 29)
〔월인석보언해〕
월인석보 19:111ㄱ
다가 受持 讀誦야 正히 憶念야 義趣를 아라 말다 修行면 반월인석보 19:111ㄴ
기 이 사미 普賢行 行야 無量 無邊 諸佛ㅅ 거긔 善根 기피 심거 諸如來 소로 머리 지샤미 아 디니【經 디 조 行이 正히 憶念호매 잇니 憶이 正티 몯면 雜想이 變亂고 念이 正티 몯면 邪習이 汨擾야월인석보 19:112ㄱ
≪汨 믈 소사나논 라≫ 기픈 行 일우려 호미 어려니라 그럴 普賢이 이 各別히 正憶念行 기시고 아래 두 번 니시니 憶念이 正면 行호미 普賢妙行 아니니 업슬 如來 머리 져 印證샤미 외리라】〔7:174ㄴ〕七勸正憶念
〔법화경〕 若有受持讀誦야 正憶念야 解其義趣야 如說修行면 當知是人은 行普賢行야 於無量無邊諸佛所애 深種善根야 爲諸如來ㅣ 手摩其頭ㅣ니다
〔법화경언해〕○다가 受持 讀誦야 正히 憶念야 〔7:175ㄱ〕그 義趣 아라 말다이 脩行면 이 사 普賢行 行야 無量 無邊 諸佛 善根을 기피 심거 諸如來ㅣ 소로 머리 지샤미 왼 반기 아롤 띠니다
〔계환해〕持經要行은 在正憶念니 蓋憶이 不正면 則雜想이 變亂고 念이 不正면 則邪習이 汩擾야 欲成深行이 難矣ㄹ 故로 普賢이 於此애 特明正憶念行시고 而下文에 再三言之시니 憶念이 既正면 則所行이 無非普賢妙行故로 爲如來ㅅ 摩頂印證이니〔7:175ㄴ〕라
〔계환해언해〕○經 디니논 조왼 行 正憶念에 잇니 다가 憶이 正티 몯면 雜想이 變야 어즈리고 念이 正티 몯면 邪 시 흐리워 어즈려 기픈 行 일우려 호미 어려울 普賢이 이 正憶念 行 特別히 기시고 아랫 文에 두 번 니시니 憶念이 마 正면 行호미 普賢 妙行 아니니 업스릴 如來ㅅ 머리 지샤 印證샤미 외요미라
[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7]
“아무나 받아 지니며 읽으며 외워 바로 억념하여 뜻을 알아 설법한 대로 수행하면 이 사람이 보현 행적을 행하여 끝없으며 가이 없는 제불께 좋은 근원을 깊이 심어 여러 여래의 손으로 머리를 만지실 것을 알 것입니다.【경을 지님에 중요한 행적은 바로 억념함에 있으니 억념(憶念)이 정(正)하지 못하면 잡상(雜想)과 사곡(邪曲)한 버릇이 어지러울 것이니 깊은 행적을 일우려 함이 어려운 것이다.】 ”
Ⓒ 역자 | 김영배·김성주 / 2012년 10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