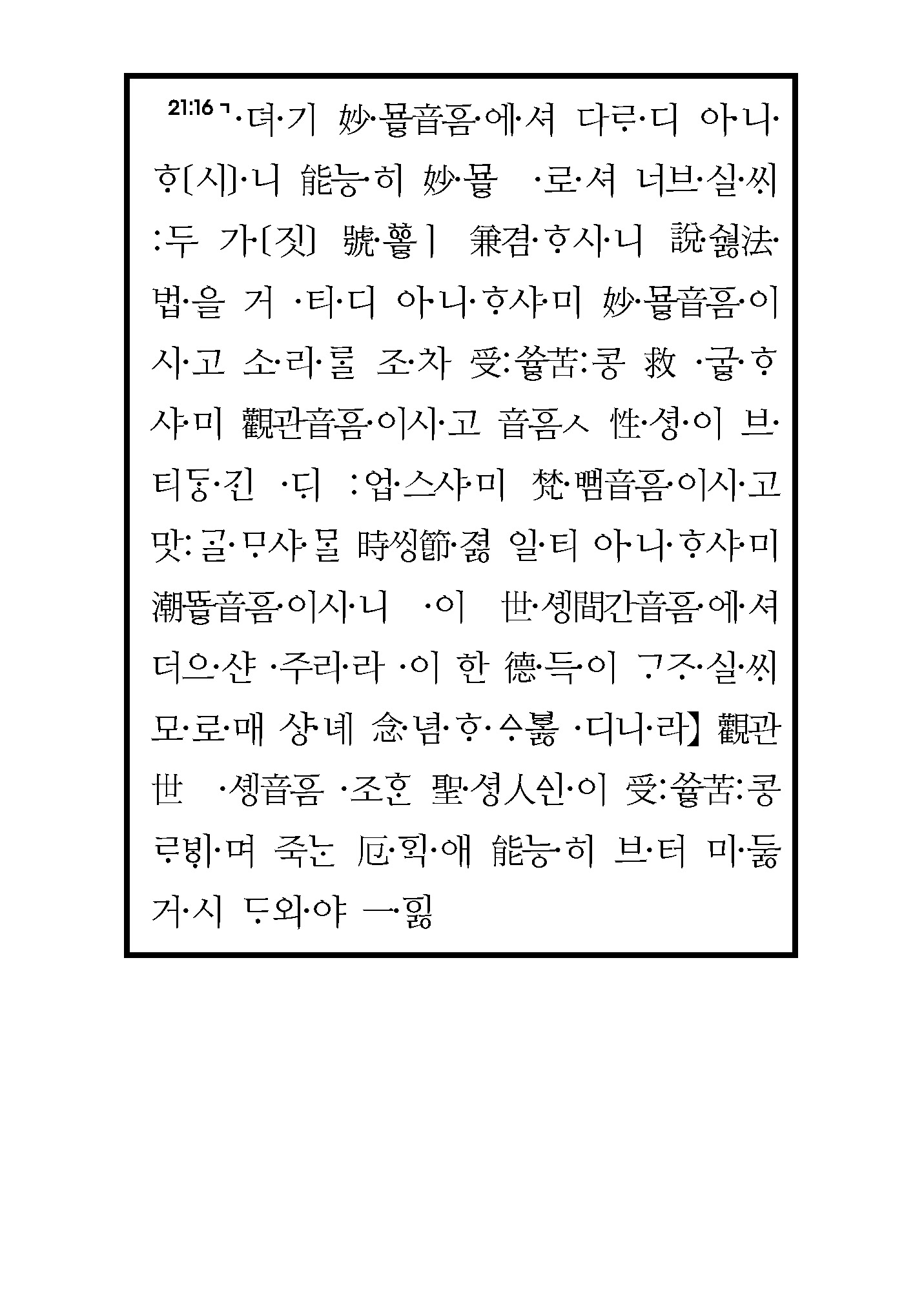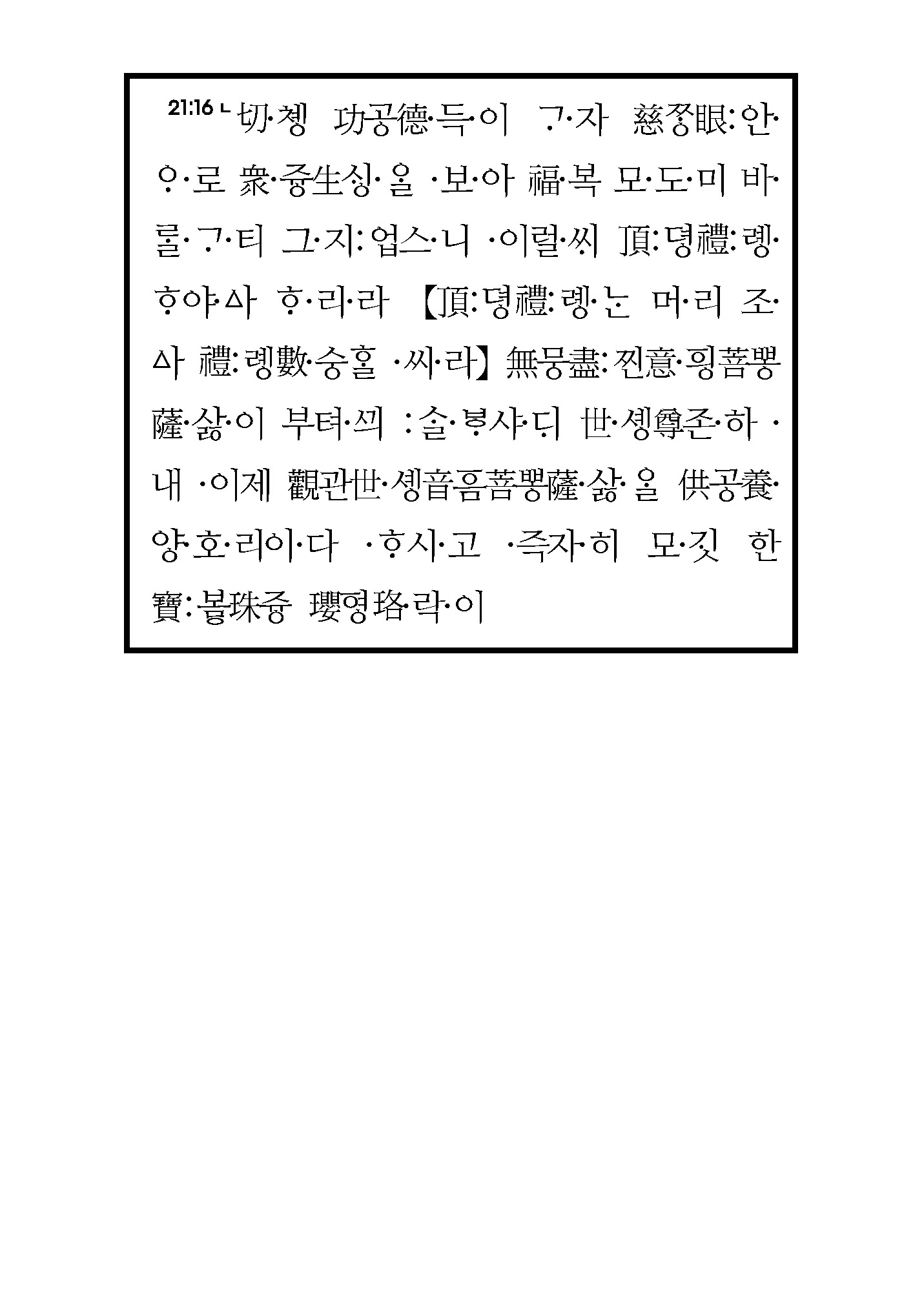- 역주 석보상절
- 역주 석보상절 제21
-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
-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 13
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 13
[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 13]
수고(受苦)며:
수고로우며. 고통을 받으며. 受苦++(/으)며(연결어미). ¶種種 受苦 病얫다가 내 일후믈 드르면 다 智慧 잇고 諸根이 자 病이 업게 호리라〈석상 9:7ㄱ〉. 受蘊은 受苦며 즐거며 受苦도 즐겁도 아니호 바 씨오〈월석 1:35ㄴ〉.
능(能)히 브터 미 거시 외야:
능히 의지하여 믿을 것이 되어. 해당 원문은 ‘能爲作依怙야’임. 〈월석〉은 해당 부분이 훼손되어 언해의 양상을 알 수 없고, 〈법화〉의 언해는 ‘能히 브터 미두리 외야’임.
석보상절 21:16ㄴ
切功德이 자 慈眼로 衆生 보아 福 모도미 주003) 모도미:
모음이. 몯-[集]+(오/우)ㅁ(명사형어미)+이(주격조사). ¶微妙 모도미 攝이오〈월석 8:25ㄱ〉.
바티:
바다같이. 바[海]+티. 바[海](평-거, 명사). ‘바다ㅎ’와는 쌍형어 관계에 있음. 어드운 길흘 비취 노 홰며 受苦ㅅ 바 건네 라〈반야 8ㄴ〉. 참조. 미 부러 受苦ㅅ 바다해 마 잇니〈월석 9:22ㄱ〉.
조:
조아려. 좃-[稽]+어/아(연결어미). 그제 梵志 두리여 그 재 알 머리 조 降服야 다 出家니 王이 더옥 佛法을 信더라〈석상 24:23ㄱ〉. 즉재 諸梵天王이 머리 조 부텻긔 禮數고〈월석 14:20ㄴ〉.
Ⓒ 필자 | 수양대군(조선) / 1447년(세종 29)
〔월인석보언해〕
월인석보 19:49ㄴ
觀世音淨聖이 苦惱死厄애 能 …*19:50ㄱ~19:56ㄱ은 낙장임(관세음보살보문품 후반부터 다라니품 전반까지임).
〔7:98ㄴ〕八頌德勸歸
〔법화경〕 觀世音淨聖이 於苦惱死厄애 能爲作依怙야 具一切功德야 慈眼으로 視衆生야 福聚海無量니 是故應頂禮니라
〔법화경언해〕○〔7:99ㄱ〕觀世音 조 聖人이 苦惱 死厄애 能히 브터 미두리 외야 一切 功德이 자 慈眼으로 衆生 보아 福聚 바티 그지업스니 이런로 頂禮홀 띠니라
〔계환해〕觀聽을 反入샤 離諸塵妄실 是謂淨聖이시고 乘彼正念샤 假之福力실 是謂依怙ㅣ시니라 具一切德시면 則隨所求而應之샤 주006) 不止十四無畏也ㅣ시며 慈視衆生시면 則擇可度而度之샤 不止三十二應也ㅣ샷다 其福聚ㅣ 如海샤 利澤이 不窮실 故로 應歸命이니라
*
『법화경 언해』에 ‘시’로 되어 있으나 ‘샤’가 와야 할 자리임.
〔계환해언해〕○〔7:99ㄴ〕觀聽을 돌아드리샤 여러 가짓 塵妄 여희실 이 니샨 淨聖이시고 뎌 正念을 샤 福力을 빌이실 이 니샨 依怙ㅣ시니라 一切 德이 시면 求호 조차 應샤 十四無畏 아니시며 衆生 慈로 보시면 濟度얌직 닐 야 濟度샤 三十二應 아니샷다 그 福聚ㅣ 바 샤 利澤이 다디 아니실 歸命올 띠니라
[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 13]
관세음보살과 같은 깨끗한 성인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등의 재액(災厄)에 대해 능히 의지하여 믿을 것이 되어 일체 공덕을 가져 자안(慈眼)으로 중생을 보고 복을 모음이 바다같이 끝없으니 이러므로 〈관세음보살께〉 정례(頂禮)하여야 할 것이다.【정례(頂禮)는 머리 조아려 인사하는 것이다.】
Ⓒ 역자 | 김영배·김성주 / 2012년 10월 9일